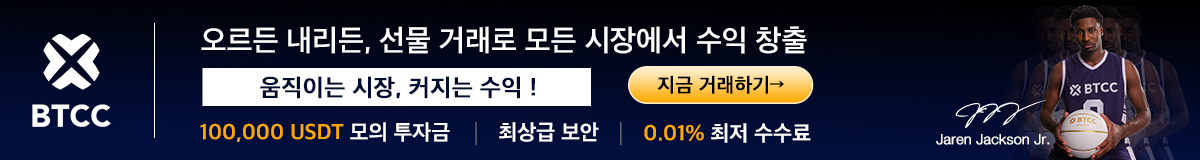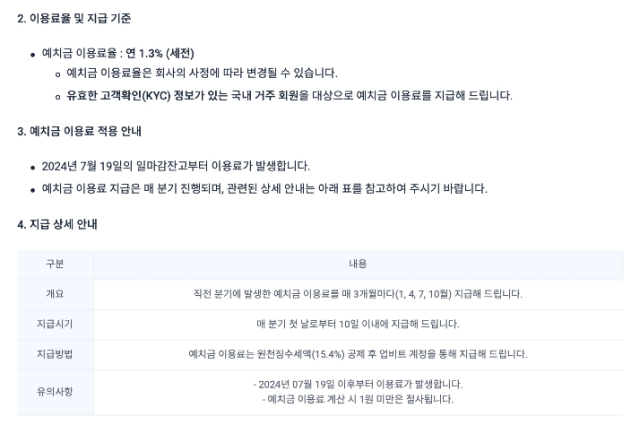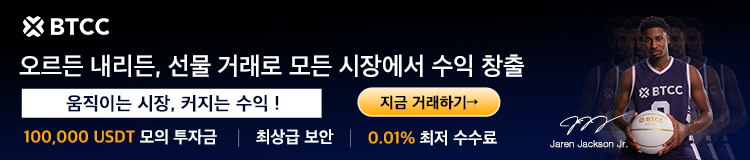자료사진.
[InfoZzin]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가 제도권 금융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3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는 더 이상 규제 바깥의 실험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기능과 책임을 시험받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며 “최근 미국 규제 기조의 전환과 함께 시장 구조와 핵심 전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디파이 생태계의 구조가 ▲거래 ▲대출 ▲자산운용의 세 축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각 섹터에서 기존 금융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부문에서는 유니스왑(Uniswap),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등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AMM) 또는 오더북 방식 기반의 프로토콜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니스왑은 자체 레이어2 체인 ‘유니체인(Unichain)’과 고도화된 버전 ‘v4 Hook’을 통해 기능과 확장성을 모두 강화한 상태다.
하이퍼리퀴드는 자체 L1 체인과 이더리움 호환 환경(HyperEVM)을 갖추고 있으며, 오더북 기반으로 일일 48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의 84%를 점유하고 있다고 코빗 리서치센터는 밝혔다.
대출 부문에서는 아베(Aave), 스카이프로토콜(Sky Protocol) 등 주요 프로토콜이 담보 기반 구조를 넘어, KYC·오프체인 신용 평가를 반영한 하이브리드 대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아베는 DAO 수익 구조를 개편하며 토큰(AAVE) 보유자에 대한 수익 재분배도 시작했다.
자산 운용 부문에서는 스파크 프로토콜(Spark Protocol)과 펜들(Pendle)이 각각 패시브·액티브 운용 전략을 대표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스파크 프로토콜은 미국 국채 기반 RWA(실물자산) 편입 등 보수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확대하고 있으며, 펜들은 포인트 파밍과 수익률 파생상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디파이를 둘러싼 미국의 규제 기조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SEC가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하고, 디파이 브로커 규정도 철회되는 등 제도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환경 변화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수익 분배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하이퍼리퀴드, 아베, 스카이 프로토콜, 펜들 등은 수익의 일부를 토큰 소각, 바이백, 재분배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스왑 또한 ‘Fee Switch’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토큰 보유자에 대한 수익 분배 도입을 재논의 중이다.
기관투자자의 디파이 참여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하이퍼리퀴드의 HYPE 토큰은 나스닥 상장사 하이퍼리온 디파이(HYPD), 캐나다 상장사 Tony G Co-Investment 등 주요 기관의 자산배분 전략에 편입되고 있다.
미국 내 입법 차원에서도 DAO에 유한책임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와이오밍, 테네시, 유타 등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며, CLARITY 법안과 함께 연방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수립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는 중개자 없는 거래와 온체인 투명성을 기반으로 전통 금융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기능 고도화, 수익모델 다변화, 규제 대응 전략이 함께 작동하며 디파이 생태계는 제도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기자

권오성 기자